한시 향 머금은 번안시조【36】
조선(朝鮮)이란 사회 관습 때문에 정실과 후실을 둘 수밖에 없었다. 후실을 먼저 맞아했지만 양반 사대부에겐 그에 걸맞은 정실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당시의 사회의 제도이고 관습이었다. 시인은 우연하게 만난 남편의 후실이 되기를 자청한 후 남편의 출제 가도를 위해 혼신을 바친다. 그리고 남편이 정실을 맞이하도록 주선한다. 이와 같은 아내가 자살이란 극단을 선택하여 그 상여의 뒤를 따르며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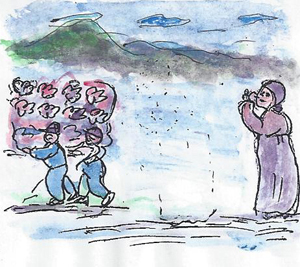
한 떨기 고운 꽃이 상여에 실려 가네
향기로운 그대 걸음 어찌 저리 더디 가나
금강에 가을비 적시니 행여 내 임 눈물일까.
一朶紅?載?車 芳魂何事去躊躇
일타홍파재이차 방혼하사거주저
錦江秋雨丹旌濕 疑是佳人別淚餘
금강추우단정습 의시가인별루여
저 비는 그리운 내 임의 눈물인가 보다(一朶紅)로 제목을 붙여본 칠언절구다. 작자는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1548~1622)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방탕의 길을 걷던 그는 운명적으로 만난 일타홍의 배려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여 1570년에 22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했다. 2년 뒤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좌의정까지 오른 인물이다. 위 한시 원문을 번역하면 [일타홍 한 떨기 고운 꽃이 상여에 실려, 향기로운 혼이 가는 곳 더디기만 하네 , 금강에 가을비 내려 붉은 명정 적시니, 그리운 내 임의 눈물인가 보다]라는 시상이다.
이 시제는 [내 사랑 일타홍]으로 번역된다. 아녀자이지만 세상에 태어나 남편을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으로 자살한 일타홍은 자기 시신을 심희수의 선산에 묻어 달라는 유서를 남긴다. 알타홍을 평생의 큰 은인으로 알고 살았던 심희수는 천생에 끊은 수 없는 인연 속에 함께 살던 그 녀의 죽음 앞에 그만 넋을 잃고 만다.
시인은 선산인 금산에 묻기 위해 떠난 일타홍을 실은 꽃상여가 금강에 이르자 홀연 가을비가 소소히 내려 주위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구슬프게 했다고 한다. 시인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참지 못해 위의 시 한 편을 남겼다.
화자는 상여 속에 실려 있는 연인을 한 떨기 꽃으로 보았다. 혼마저 차마 발길이 놓지 못했던지 옮기는 발길마다 더디 가고 있음을 한스러워한다. 금강(錦江)을 적시는 가을비가 붉은 바탕 하얀 글씨의 명정(銘旌)을 적시니 그 빗방울이 살아있을 때 미처 다 거두지 못한 일타홍의 눈물은 아닌가 모르겠다는 화자의 깊은 심회를 담는다.
【한자와 어구】
一朶紅: 일타홍, 사람이름. ?: 한 떨기. 載?車: 차에 실려 가다. 芳魂: 향기로운 혼백. 何事: 무슨 일로, 어찌 이다지도. 去躊躇: 더디게 가다. // 錦江: 금강, 충남에 흐르는 강. 秋雨: 가을비. 丹旌: 붉은 명정. 濕: 젖다. 疑: 의심하건데. 是: 이다. 佳人: 내 임. 別淚餘: 이별의 눈물 흔적.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