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향 머금은 번안시조【104】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을 한다. 군에 다녀 온 사람들의 군번에 대한 이야기는 졸병 때의 이야기보다는 고참 때의 이야기, 이른 바 ‘자기 자랑’의 일색이 된다. 모든 것이 큰 추억거리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의 제1의 자랑은 누구 누구는 ‘내 밑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구수함을 더한다. 시인은 밤을 지새웠던 모양이다. 답답함도 없고 마음에 근심도 없으니 옛 사람의 시에 차운하여 자기 처지를 비교해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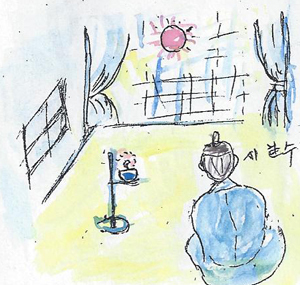
창문이 환해지고 둥근 달은 떠오르네
마음속 답답하여서 옛사람 시 답한다네.
篆冷香殘後 窓明月上時
전냉향잔후 창명월상시
有懷無與晤 聊和古人詩
유회무여오 료화고인시
밤중에 두보의 시에 맞춰 시를 짓다(夜坐次杜詩韻1)로 제목을 붙여보는 율의 후구인 오언율시다. 작자는 유항(柳巷) 한수(韓修:1333~1384)다. 학식과 행의(行儀)가 뛰어났고, 초서와 예서에 능했다. 노국대장공주묘비(魯國大長公主墓碑) 등이 그의 필적으로 남아 있다. [동문선]에 단편이 남아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위 한시 원문을 번역하면 [연기 냄새 식으니 향불은 꺼지고, 창문이 환해지면서 둥근 달이 떠오르네. 마음속 답답하나 함께 할 이 없으니. 애오라지, 옛 사람의 시에 응대하며 답이나해보네]라는 시상이다.
전구에서 시인이 읊은 시심은 [오늘도 또 날이 저물어가고, 무심한 백년 세월 참으로 슬프구려. 마음먹은 대로 일은 되지 않고, 몸이 늙어 병마저 따라서 생겼다네]라고 하면서 공명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쏟아냈다.
시를 지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부운과 같은 세상의 공명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시인을 만난다.
젊어서 자기 몸이 아니듯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무언가는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자연과 벗하면서 살고 싶다는 자기 의지를 보인다. 향불이 꺼지는 것과 창문이 환해지는 둥근 달이 떠오른 것과도 큰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몸이 늙어 식어간다는 뜻을 내포하게 된다.
화자가 하고 싶은 건 딱 한가지만 남는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시인의 시에 응대하는 일, 그것뿐이다. 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시를 읽고 감상하면서 운자에 차운하면서 시를 짓는 일에 몰입하는 작가적 태도를 갖겠다는 것이다.
【한자와 어구】
篆冷: 연기 냄새가 사라지다. 香殘: 향불이 꺼지다. 後: ~한 후에. 窓明: 창문이 환해지다. 月上時: 달이 떠오를 때에.
有懷: 마음에 회포가 있다. 無與晤: 더불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 聊: 애오라지. 어세를 높이는 조사. 和: 화답하다. 응대하다. 古人詩: 옛사람의 시. 고인의 시문.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