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향 머금은 번안시조【61】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고 읽는다. 훗날 세종성군이 된 효령대군에서 임금의 자리를 양보하려는 속셈이었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진심은 내막은 그렇지 않았다. 임금의 재목이 되지 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후세의 이야기다. 양녕은 그랬다. 예술적 재질을 타고난 그는 궁중의 생활이 싫었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 그런 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노래와 그림 그리고 시를 짓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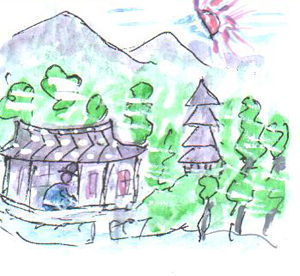
산 노을로 불을 때서 아침밥 지어먹고
담장이 넝쿨 비친 달로 등불을 삼았구나
한 충만 홀로 남은 석탑 지켜낸 이 누구인가.
山霞朝作飯 蘿月夜爲燈
산하조작반 라월야위등
獨宿孤庵下 惟存塔一層
독숙고암하 유존탑일층
산 노을로 아침밥을 지어 먹었더니만(題僧軸)로 제목을 붙여본 오언절구다. 작자는 세종의 형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1394~1462)이다. 동생인 충녕대군(忠寧大君)에게 왕세자의 지위를 물려주고 풍류를 즐기며 여생을 보냈으며, 세종과 돈독한 우애를 유지하였다. 글씨에 매우 뛰어났다.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강정’이다. 위 한시 원문을 번역하면 [산 노을로 아침밥을 지어 먹고, 담장이 넝쿨에 비친 달로 등불 삼았었네. 외로운 암자 아래서 홀로 잠을 자는데, 오직 한 층만이 남아 있는 저 탑은…]라는 시상이다.
시제를 직역하면 [스님의 두루마리를 보면서]로 번역된다. 태종의 뒤를 이어 옥좌를 거머쥐어야 할 막강한 자리에 있었지만, 자연과 세상을 더불어 하며 살고 싶어했던 작자였기에 시문의 속살을 벗길 듯해진다. 스님이 입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시상을 일으켰던 것이 시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시인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다. 산 노을로 아침밥을 지어 먹었더니 배고픔이란 1차적인 시름 하나는 덜었다. 창가에 비친 달빛이 아니라, 담장이 넝쿨이 비친 달빛을 등불로 삼아서 책을 읽었으니 하고자 하는 2차적인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했으니 더 바랄 것은 없어 보인다.
화자는 이런 정경을 배경 삼아 외로운 암자 아래서 잠을 자는 또 다른 외로운 대상을 발견한다. 오직 한 층만이 남아있는 석탑을 보면서 절정에 도달하는 시상을 품에 안았기 때문이다. 한 층만이 남아 있는 석탑은 화자 자신이었을 것이다. 외로운 달과 더불어…
【한자와 어구】
山霞: 산 노을. 朝: 아침. 作飯: 밥을 짓다. 아침밥을 하다. 蘿: 담쟁이. 月夜: 달밤. 爲燈: 등을 삼다. 등불로 여기다. 爲: ‘~을 삼다’는 뜻임
獨宿: 홀로 자다. 孤庵下: 외로운 암자 아래에서. 곧 앞의 [獨]과 [孤]과 외롭다는 뜻을 더하고 있다. 惟: 오직. 存:~이 있다. 塔一層: 탑 한 층만.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